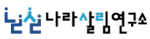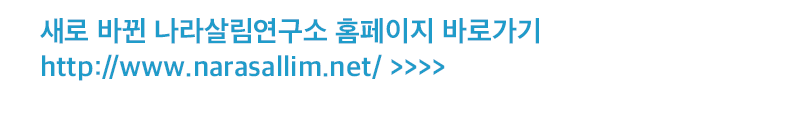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이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 요구가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 상반기에만 세 차례에 걸쳐 추경이 이루어지는 등 본격적인 재정확대가 이뤄질 예정이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하는 건 공공부문의 기능 및 규모다. 공무원 신규임용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공공부문 일자리라도 늘려 고용문제의 물꼬를 트겠다는 건 현 정부의 기본정책임에도, 공감대는 높지 않다.
통계청 ‘2018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취업자 수 대비 공공부문 일자리는 9.1%, 일반정부 일자리는 7.8%다. 일자리 수로는 전체 2682만 명의 취업자 중 공공부문 245만 개, 일반정부 209만 개다. 일반정부 일자리 가운데 ‘직접 일자리’라고 볼 수 있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관련 일자리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비 중상위 수준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의 ‘신분상’ 공무원이 많은 편이라는 얘기다. 공무원 수가 적다고 하는 것은 다소 과소평가된 측면이 있다.
또 하나 특징은 중앙정부 내 공무원의 비중이 OECD 평균 대비 10.6%포인트나 높다는 점이다. 공공부문에서 직접 사회서비스를 하는 일자리보다 행정을 처리하는 일자리 비중이 높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중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통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정부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사학연금 가입 교직원, 사회복지 및 어린이집 시설 종사자, 노인일자리 규모는 정부 발표 일반정부 일자리의 67.7%에 달하는 규모다. 의무사병·사회복무요원 등도 공공부문에 종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민간위탁·보조금 등의 형태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의 지원으로 재정을 충당하는 직업군 규모도 상당하다. 본격적인 재정확대에 앞서 공공부문의 범위와 기능을 명확히 하고 정확한 통계 산출 및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한국의 공무원은 다른 나라에 비해 공개 경쟁시험 비중이 월등히 높고, 공무원 임용 개방성 지수는 상당히 낮다. 또 직업안정성이 평균보다 높고, 중앙정부 내 공무원과 비공무원 간 격차가 크다. 공무원과 비공무원 간 격차는 공직 임용 개방성을 저해하고 조직 내 칸막이로 작용해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해친다. 이 같은 구분과 차별적 대우의 합리성 및 효율성에 대해 점검하고, 공공부문 종사자의 정의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신분으로서의 공무원을 역할로서의 공무원, 세금으로 봉사하는 공무원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신분은 권력이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우리나라 공무원은 많은가 적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이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 요구가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 상반기에만 세 차례에 걸쳐 추경이 이루어지는 등 본격적인 재정확대가 이···
weekly.kh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