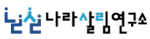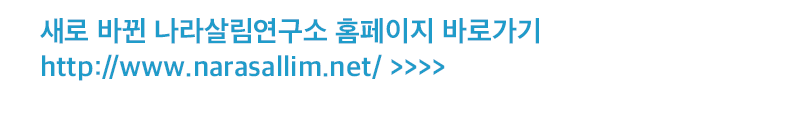며칠 전 ‘지방교육재정 효율성 및 건전성 재고실태’라는 감사원 보고서가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초등학생수가 2014년 638만 명에서 2018년 567만 명으로 줄었고, 2035년에는 382만 명까지 감소한다. 그런데 재정은 2014년에 40조원에서 2018년에 52조원으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그래서 받은 만큼 써버리는 밀어내기식 지출인지, 필요에 의한 집행인지 확인해보았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최근 재정구조개혁의 논의에서 가장 주목받는 곳이 교육재정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2020년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를 보면 2010년 442만원이었던 1인당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2018년 922만원이 되었다고 한다. 2020년에는 1100만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오래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지방재정교부세와 교육청에 주는 교육재정교부금을 우선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을 합치면 내국세의 40%가 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300조원 세금을 거두면 120조원을 지방에 자동적으로 주게 되는 셈이니 이것을 건드리고 싶은 것이다. 그런데 지자체의 지방재정교부세는 지방분권이라는 추세 때문에 말을 꺼내기가 힘들어졌다. 특히 분권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는 현 정부에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차선책으로 교육재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한 것이다. 논의가 확대되는 이유는 재정건정성을 주장하는 시각에 더해 교육자치에 회의를 가지는 전문가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교육재정이 방만한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나오기 시작하자 기재부는 군불을 때기 시작했다. 지난해 말 기재부가 조세재정연구원에 의뢰한 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산과 고령화 속에 학생수가 점차 줄어들면서 4년 뒤면 지방교육재정 세입의 20%가 남아돌게 될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이에 따라 교육재정을 줄이겠다는 입장이고, 교육부는 학생수가 줄어도 선진교육의 질 확보와 교육복지의 확대, 인공지능·빅데이터 같은 미래교육을 위해 교육재정이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중략)
물론 모든 것을 비용으로만 보는 입장은 바람직하지 않다. 위기의식 없이 재정개혁에 관심 없는 교육 쪽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내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재정구조를 혁신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개혁에 대한 중장기 개혁을 세우고 그러한 차원에서 재정의 규모와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평생교육의 시대, 학생만 상대하는 교육자치는 설 자리가 매우 좁다. 보편 속의 특수를 주장해야 하는데 특수만을 이야기하면 설득력이 부족하다. 아예 교육자치를 부정하고 행정과 교육을 통합하자는 주장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교육부 역시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여긴다. 지방의 교육계만 모르고 있을 뿐이다. ‘설마’ 할 때가 아니다.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지방교육재정 근본적인 변화가 오는가
며칠 전 ‘지방교육재정 효율성 및 건전성 재고실태’라는 감사원 보고서가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초등학생수가 2014년 638만 명에서 2018년 567만···
weekly.kh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