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17.02.06 최훈길 기자
'최순실 예산' 4000억 드러나, 구멍 뚫린 예산 시스템
지자체장·CEO 손배 당해도 세금낭비 장관은 열외
기재부 "소송 남발로 행정 위축되면 결국 국민 손해"
"예산 정보 틀어쥔 관료 때문에 소송 차단돼" 반론도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문재인 캠프가 혈세를 낭비한 관료를 대상으로 국민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국민소송법(납세자소송법)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정치권과 관료 간 신경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치권은 최순실 등 비선 실세에 농락된 국가예산 시스템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명분으로 여론 지지를 얻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관료들은 명분엔 공감하면서도 제도가 공무원을 옥죄는 식으로 악용·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현실적 부작용을 제기했다.
◇명분론..“혈세낭비 막자”
정치권에서 최근 국민소송법 논의가 불거지는 건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야당은 최순실·차은택 씨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업을 이른바 ‘최순실 예산’으로 분류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등에서 4000억원을 감액했다. 최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정부의 예산 데이터베이스(DB)를 확보해 비정상적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도 수사 중이다. 드러나지 않은 ‘최순실 예산’이 수년간 수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현재 세금을 낭비하면 지방자치단체장에는 주민소송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장관은 대상이 아니다. 국가를 상대로 한 납세자소송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민사소송법상 원고 자격을 인정 받지 못한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미국은 납세자소송으로 2011년까지 약 20조원을 환수했다”며 “국가가 예산 집행을 잘못해 세금을 낭비하더라도 피해자인 국민에게 손배 권리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건 이상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헌법 등을 고려하면 국민소송법 도입이 오히려 늦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헌법(29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100조)에도 예산 집행자가 법령을 위반해 국가에 손해를 줬을 경우 누구든지 기관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지자체장이나 기업 CEO도 경영을 제대로 못하면 손배소송을 당하는데 중앙부처 장관은 열외인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도 도입 명분 자체를 반대하진 않는다. 강준모 기획재정부 재정집행팀장은 “국민 참여를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 참여민주주의 강화, 행정에 대한 외부 감시 기능 등 국민소송법 도입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현실론..“소송 남발로 관료 옥죄기”
하지만 정부 측에선 실제 도입하는 데에는 반감이 강하다. 특히 소송 남발 가능성을 우려한다. 강 팀장은 “특정 지역의 이익을 위해 국책사업에 소송을 걸어 사업을 중단시키거나 보상금을 노리고 소송을 남발할 수 있다”며 “소송 부담으로 행정이 위축되면 결국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다른 국민들이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현재도 불필요한 민원성 신고가 상당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예산낭비신고센터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처리한 1만2854건 신고 중 단순 민원성 신고 등이 1만1873건(92.4%)에 달했다. 게다가 감사원 감사청구,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방위사업청·국방부 등 부처별 비리 신고 제도까지 포함하면 현재도 신고 건수가 많고 제도도 중복될 것이란 입장이다. 고의적인 사기로 소송 여건을 제한하고 있는 미국의 허위청구 방지 소송의 경우에도 1986년부터 2008년까지 총 6199건(연간 282건)의 소송이 제기됐다.
게다가 정부는 해외에서도 국민소송법을 전면적으로 도입한 선례가 없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국을 제외한 해외 주요국가의 경우 중앙(연방) 정부를 상대로 인정한 사례가 없다”며 “미국의 경우에도 납세자 소송은 주정부에서 인정되고 연방정부에 대해서는 한정적으로 인정될 뿐”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1847년 뉴욕시장을 피고로 하는 납세자소송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이어 1968년 연방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연방정부에 대한 납세자 소송도 가능해졌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기재부가 엄살을 부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수진 변호사(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는 “현행 주민소송과 유사하게 위법한 재정 행위만을 소송 대상으로 정하면 소송이 남발될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주민소송이 시행된 2006년 이후 작년 6월 1일까지 제기된 소송은 32건(연평균 3건)이었다.
오히려 100여년 전부터 미국 등에 제도가 도입된 선례를 감안하면 우리 정부가 늦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윤영진 계명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국민소송법의 모델인 미국의 연방부정청구방지법은 100여년 전인 1863년 링컨법으로 제정됐다”며 “현재는 31개 주정부, 뉴욕·시카고 등 7개 시 정부에 널리 입법됐다”고 지적했다.
17대 국회부터 네 차례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료들이 국민소송법을 반대하는 진짜 속내는 세금 낭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심리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정창수 소장은 “관료들이 예산 정보를 틀어쥐고 있기 때문에 소송 남발보다는 소송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이라는 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소송법=국가기관이 위법한 재정 행위 등을 했을 경우 납세자인 국민이 장관 등 중앙정부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제기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주민소송을 중앙정부로 확대하자는 게 골자다. 도입 논의는 2000년 당시 경기 하남시민 266명이 186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며 하남시장을 상대로 환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2003년 참여정부에서 ‘납세자소송’ 이름으로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이후 2006년 1월 지자체의 예산 낭비 등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주민소송제가 우선 도입됐다. 정권이 바뀌면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국민소송제 도입은 무산됐다. 지난해 16년 만에 여소야대 국회가 출범하고 ‘최순실 예산’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천정배·이상민·박주민 의원 등이 국민소송법을 대표발의 했거나 발의를 준비 중이다.
◇명분론..“혈세낭비 막자”
|
현재 세금을 낭비하면 지방자치단체장에는 주민소송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장관은 대상이 아니다. 국가를 상대로 한 납세자소송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민사소송법상 원고 자격을 인정 받지 못한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미국은 납세자소송으로 2011년까지 약 20조원을 환수했다”며 “국가가 예산 집행을 잘못해 세금을 낭비하더라도 피해자인 국민에게 손배 권리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건 이상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헌법 등을 고려하면 국민소송법 도입이 오히려 늦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헌법(29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100조)에도 예산 집행자가 법령을 위반해 국가에 손해를 줬을 경우 누구든지 기관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지자체장이나 기업 CEO도 경영을 제대로 못하면 손배소송을 당하는데 중앙부처 장관은 열외인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도 도입 명분 자체를 반대하진 않는다. 강준모 기획재정부 재정집행팀장은 “국민 참여를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 참여민주주의 강화, 행정에 대한 외부 감시 기능 등 국민소송법 도입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현실론..“소송 남발로 관료 옥죄기”
|
정부는 현재도 불필요한 민원성 신고가 상당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예산낭비신고센터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처리한 1만2854건 신고 중 단순 민원성 신고 등이 1만1873건(92.4%)에 달했다. 게다가 감사원 감사청구,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방위사업청·국방부 등 부처별 비리 신고 제도까지 포함하면 현재도 신고 건수가 많고 제도도 중복될 것이란 입장이다. 고의적인 사기로 소송 여건을 제한하고 있는 미국의 허위청구 방지 소송의 경우에도 1986년부터 2008년까지 총 6199건(연간 282건)의 소송이 제기됐다.
게다가 정부는 해외에서도 국민소송법을 전면적으로 도입한 선례가 없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국을 제외한 해외 주요국가의 경우 중앙(연방) 정부를 상대로 인정한 사례가 없다”며 “미국의 경우에도 납세자 소송은 주정부에서 인정되고 연방정부에 대해서는 한정적으로 인정될 뿐”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1847년 뉴욕시장을 피고로 하는 납세자소송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이어 1968년 연방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연방정부에 대한 납세자 소송도 가능해졌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기재부가 엄살을 부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수진 변호사(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는 “현행 주민소송과 유사하게 위법한 재정 행위만을 소송 대상으로 정하면 소송이 남발될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주민소송이 시행된 2006년 이후 작년 6월 1일까지 제기된 소송은 32건(연평균 3건)이었다.
오히려 100여년 전부터 미국 등에 제도가 도입된 선례를 감안하면 우리 정부가 늦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윤영진 계명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국민소송법의 모델인 미국의 연방부정청구방지법은 100여년 전인 1863년 링컨법으로 제정됐다”며 “현재는 31개 주정부, 뉴욕·시카고 등 7개 시 정부에 널리 입법됐다”고 지적했다.
17대 국회부터 네 차례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료들이 국민소송법을 반대하는 진짜 속내는 세금 낭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심리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정창수 소장은 “관료들이 예산 정보를 틀어쥐고 있기 때문에 소송 남발보다는 소송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이라는 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소송법=국가기관이 위법한 재정 행위 등을 했을 경우 납세자인 국민이 장관 등 중앙정부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제기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주민소송을 중앙정부로 확대하자는 게 골자다. 도입 논의는 2000년 당시 경기 하남시민 266명이 186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며 하남시장을 상대로 환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2003년 참여정부에서 ‘납세자소송’ 이름으로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이후 2006년 1월 지자체의 예산 낭비 등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주민소송제가 우선 도입됐다. 정권이 바뀌면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국민소송제 도입은 무산됐다. 지난해 16년 만에 여소야대 국회가 출범하고 ‘최순실 예산’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천정배·이상민·박주민 의원 등이 국민소송법을 대표발의 했거나 발의를 준비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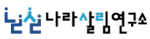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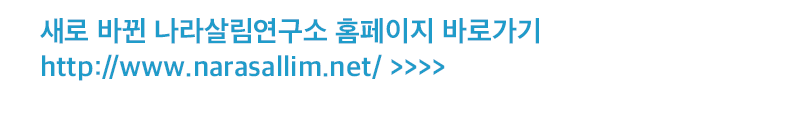
![[최순실 예산 이후]②국민소송법 충돌..`혈세낭비 방지` Vs `관료 옥죄기`](http://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17/02/PS17020600037.jpg)
![[최순실 예산 이후]②국민소송법 충돌..`혈세낭비 방지` Vs `관료 옥죄기`](http://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17/02/PS1702060003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