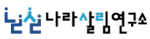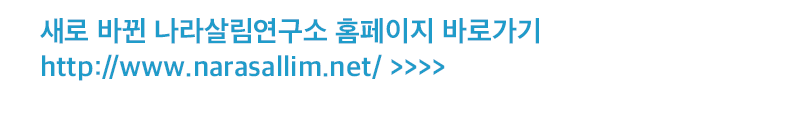이 세상의 "논리"로 설명 불가능한 모든 것이 "음모"로 설명된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과학(논리)" 이전 시대에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던 "신비"의 대체 개념인지도 모른다. 즉 근대 이전의 "신비"가 오늘날에 와서는 "음모"로 대체된 것이다. 그리고 진위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이 자체는 무척이나 "유용한" 개념이다.
가장 대중적인 혁명중의 하나인 프랑스 대혁명에 대해서도 음모론이 제기되었다. 쟈코뱅당은 프랑스 혁명당시 온건파 지롱드당에 반하여 과격파로 분류되던 정파이다. 프랑스 혁명당시 예수회 수사였던 아베 바루엘은 “자코뱅주의의 역사에 대한 회고록”이라는 책에서 혁명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쟈코뱅당 핵심인사들의 음모에 의해서 였다고 주장한다. 자코뱅은 프랑스혁명 때 제3 신분 대표들이 자주 모였던 수도원의 이름이다.
역사가인 토크빌은 프랑스혁명의 원인을 오히려 경제발전과 정치적 자유의 확장에서 찾았다. 이전보다 악은 적어졌지만 악에 대한 국민의 감수성은 더 예리해져 혁명이 일어났다는 얘기다. 음모론에 근거한 기득권층의 행태는 이런 감수성에 불을 붙이는 역할을 했다.
이와 같은 음모론은 사회의 상황이나 역사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몇몇 때문에 모든상황이 일어나므로 그들만 제거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다분히 개인주의적 사고의 확장이다. 그래서 역시나 음모를 자주 사용하는 파시즘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드라마 X파일 주인공 멀더의 사무실 벽에 붙어있는 포스터. UFO 사진과 함께 "나는 믿고 싶다"는 문구가 눈길을 끈다.
2차대전 전후 일어난 반유대주의 열풍은 ‘유대주의 음모론’이 촉발했다. 또한 동경대지진 같은 경우에도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는 음모론으로 재일 조선인들이 처참한 수난을 당하기도 했다.
‘아니면 말고 ’식의 재미삼아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데 ‘반드시 그렇다’라는 것은 현실정치와 대중적 망상과 결합하는 경우에 집단적인 광기를 불러올 수 있다.
이른바 음모론의 "주역"으로 사람들이 지목하는 존재가 대개는 외계인, 외국인, 비밀결사 등 전형적인 "타인"이라는 점에서도 이런 파시즘적 논리가 드러난다. 즉 "우리"와 다른 "타인"이 "우리"를 해코지하려 한다는 피해망상의 논리인 것이다. 그렇다면 음모론 자체도 "음모"일까?
지난 20여년의 민주화 결과 문제점에 대해 무척이나 감수성이 예민해진 우리국민들에게 음모론으로 터무니없는 억지주장을 펴는 것은 더욱더 우리 민족이 특별히 가지고 있다는 홧병을 불러일으킬지도 모르겠다.
체스터튼이라는 작가의 <오소독시>에 이런 구절이 있다. "광인의 설명은 실제로 온전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의 설명만큼 완벽하다. 그러나 그의 설명은 대다수의 사람이 고개를 끄덕일 만한 것이다. (...) 광인의 이론은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 그러나 그의 이론은 그 많은 것을 많은 방법으로 설명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