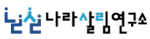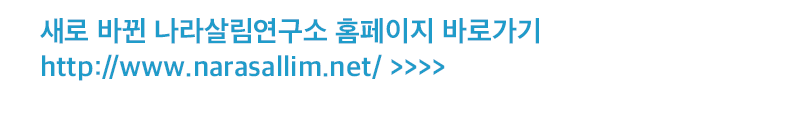모처럼 서울 시내 도로가 한산해졌다.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떠났기 때문이다. 한산한 도로를 보면 우리 교통이 얼마나 혼잡한가를 새삼 알게 된다. 사실 우리의 교통 혼잡은 전세계에서 비교 대상을 찾기 힘들다. 교통시설에 대한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승용차 의존도는 심해져 도시 교통 혼잡은 가중되고, 도시의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서울 등 대도시의 최근 10년간 인구는 연평균 0.06% 늘어났지만 승용차는 연평균 4.17% 증가했다. 도시지역 혼잡비용이 매년 4.7% 늘어나 2008년에는 17조원에 이르렀다.
교통 혼잡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교통유발부담금이다. 원인자 부담 및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 주택을 제외한 일정규모 시설물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1990년부터 1000㎡ 이상의 건물에 대해, ㎡당 350원을 부과하고 있다. 더 이상 공급관리로는 문제를 풀 수 없기에 수요관리로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이미 다른 나라들이 시행하는 것을 참고한 것이다.
문제는 이 부담금의 기준이 지난 20년간 한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대부분의 지자체는 감경조처까지 취하여 2011년에는 징수액이 1751억원에 불과하다. 이 중 액수가 가장 많은 서울의 경우에도 혼잡비용이 7조원인데, 부담금 징수는 610억원에 불과하다.
최근 환경운동연합이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63.9%의 시민들이 교통유발부담금 인상에 찬성했으며, 29.3%는 1000원으로의 인상에 찬성하기도 했다. 이는 서울시민의 차량 보유가 400만대에 달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압도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달 중순 기획재정부 산하 부담금 심의위원회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 인상 심의를 논의할 예정이다. 그런데 최근 정부 일각에서는 경제에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축소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마치 감세나 규제완화를 할 때의 논리와 비슷하다.
정부는 법과 재정으로 공공성을 지켜낸다. 이 두 가지를 활용해서 지원과 규제를 한다. 부담금도 그 방법 중 하나다. 모든 법과 세금은 부담만 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늘려야 할 것도 많다. 이런 의미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은 수요관리 차원에서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더구나 교통부문은 에너지의 19.7%를 소비한다. 따라서 경쟁력과 환경문제 모두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 교통유발을 한 원인자 부담은 당연하고, 교통수요를 줄이는 방향이어야 한다.
물론 형편에 따른 차등징수와 시설 소유자들의 자발적 수요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정책이 필수적이다. 100%까지 감면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실효성이 높아지면 혼잡은 줄고, 대중교통이 활성화되며, 적자는 개선된다. 또한 대형 유통센터 등은 비용이 증가하여 전통시장이나 자영업자 등의 상대적인 경쟁력이 증가할 것이다. 환경개선은 당연히 따라온다.
정부의 한편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실효성이 낮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선택은 단순하다. 실효성을 높이든지, 필요 없다면 폐지하는 것이다. 교통 혼잡의 원인과 해법을 명확히 해야 한다. 도로가 부족해서라면 도로 공급 중심의 성장정책으로 가야 한다. 차량이 많아서라면 부담금으로 수요를 관리해야 한다. 무엇이 지속가능할까. 솔직해져야 한다. 말로는 수요관리를 하겠다면서, 건물에는 부담금을 감면해주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등에는 예산을 지원하는 모순되는 정책을 펴고 있다. 결국 밑 빠진 독처럼 예산만 낭비하는 지속 불가능한 정책이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