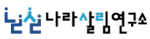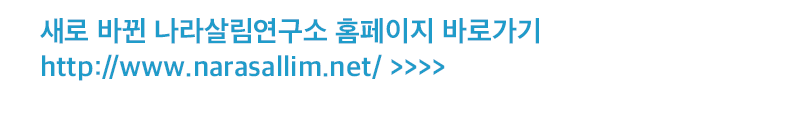왜곡된 지원은 단순히 비효율과 특혜를 넘어 우리 발전을 가로막는다. 좀비기업들은 저가 입찰로 나갈 수밖에 없고, 이는 건전한 중소기업들의 발목을 잡게 된다. 과잉투자를 유발하고 거품을 만들어 경제위기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해 존재한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은 존립할 수 없다. 기업이 이익을 내지 못하고도 존재한다면 그것은 일시적으로 빚을 내거나 아니면 어디에선가 적자를 메워주는 곳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기업을 분류하는 기준 중의 하나로 ‘한계기업’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한계기업이 많다. 정확히 말하면 매우 많이 오래 지속되어 왔다. 한계기업은 영업이익이 이자를 갚기에도 부족한 기업을 말한다.
(중략)
국회는 이미 2015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통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R&D 사업에서 한계기업 지원이 증가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는 산업통상자원부 외에 다른 부처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2017년 결산 기준으로 보면 12개 부·처·청의 132개 R&D 사업에 대한 분석 결과 한계기업 지원 비중이 2012년 5.7%에서 2017년 9.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2017년 부처별 한계기업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18개 사업)는 4.4%에서 9.3%로, 산업통상자원부(48개 사업)는 5.8%에서 9.3%로, 중소벤처기업부(7개 사업)는 3.5%에서 8.1%로, 보건복지부(11개 사업)는 23.1%에서 32.6%로, 농림축산식품부(8개 사업)는 6.1%에서 11.8%로, 농촌진흥청(10개 사업)은 0%에서 19.4%로 증가하였다.
한계기업은 정부 지원을 받아도 자체적으로 투자를 지속하기 어려우며 R&D 과제 완료 후에도 후속 투자가 어려울 수 있어 정부 지원 성과가 매몰될 우려가 있다. 또한 기업의 역량에 비해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 기업의 투자나 사업화 성과로 연계되지 못할 경우 지원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으며, R&D 자금에 의존하여 연명하는 기업을 양산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향후 R&D 지원 대상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재정지원은 한계가 있다. 실질적인 강화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과당경쟁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뻔히 실패할 사업에 뛰어들지 않게 해야 한다.
국가는 기업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한다. 단기적인 시장원리가 통하지 않는 사회복지가 그것이다. 더구나 이는 비용이 아니라 장기적인 투자임이 입증되었다. 자본이 아픈 것만 생각해서는 미래가 없다. “아프다고 망설이다가는 목숨을 잃는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