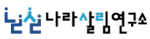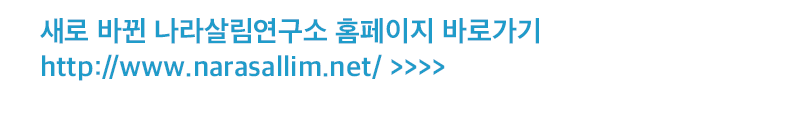[한국일보] 16.1.11 이대혁 김현수 기자
누리과정 예산 갈등은 결국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먼저 쓰느냐는 문제다. 박근혜 정부가 복지공약을 적극 앞세워 돈 쓸 곳은 많아진 반면 재원대책은 미비한 바람에 중앙과 지방의 싸움으로 비화됐다.
더 큰 문제는 반복되는 땜질 처방으로 매년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나서서 당장의 보육대란은 피하되 결국 국가 전체의 교육ㆍ보육ㆍ복지재정 현황을 점검하고 세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어디서 절감해야 하나
교육부는 최근 정부의 목적예비비 3,000억원과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1조6,000억원을 추가해 누리과정 예산을 다시 짜라는 공문을 17개 시ㆍ도교육청에 보냈다. 들어올 세입이 추가됐고, 자체적으로 줄일 부분까지 더하면 누리과정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일부 전문가들도 이런 정부 입장을 수긍하고 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중앙정부에서 주장하듯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전부 편성할 정도는 아니지만 예산 집행에서 개선할 점은 있을 것”이라며 “검증 없이 나눠주기 식인 학교운영비, 학교 환경 개선, 교육 프로그램 등의 지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감들의 공약 사항이나 학교들이 요구하는 사업 중 방만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없지 않다는 것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세무학과)도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도농 학령 인구격차가 큰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과 방식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며 “무상급식과 노인연금, 무상보육 중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무상급식은 미뤄도 된다는 설문 결과도 있다”고 말했다. 백웅기 상명대 교수(금융경제학) 역시 “학령인구는 계속 줄고 있는 반면, 60대 이상 노년층 비중은 급증해 교육청의 지출항목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선진국에서는 경기가 어려울수록 교육에 더욱 투자한다며 교육예산을 위해 다른 분야의 예산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반상진 전북대 교수(교육학)는 “한국은 교육 관련 투자에 대해 ‘불필요하고 방만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며 “비리가 많은 국방부 예산, 4대강 사업 등 대통령의 의중에 따른 대규모 예산 등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산은 중앙정부가, 집행은 지방정부가”
누리과정 갈등의 뿌리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역할분담이 명확하지 않은 우리 정치ㆍ행정 현실이 있다. 최병대 한양대 교수(행정학과)는 “복지 서비스 자체가 정치적 이슈가 되면서 선거 때마다 팽창돼 왔다”며 “문제는 중앙-지방 정부 간 역할이 불분명해 갈등과 딜레마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현재 단위사무 중심의 중앙-지방 간 업무 배분을 기능에 따른 배분으로 바꿔야 한다는 게 최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인허가 업무 과정의 5개는 중앙이, 5개 과정은 지방에 걸쳐 있는 식인데, 예컨대 노인복지는 중앙이, 교육ㆍ보육은 지방이 하는 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복지정책을 지방정부에 넘길 경우 예산을 마련해 재원까지 전부 함께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을 맡고 있는 김형기 경북대 교수(경제학)는 “복지의 분권화가 이뤄지면서 재정부담은 중앙정부가, 집행은 지방정부가 맡는 것이 주요 선진국의 기본 원칙”이라며 “프랑스, 독일 등은 지방정부에 중앙정부의 사무를 이행할 때 상응하는 예산ㆍ재원도 지방정부에 주도록 헌법에 못 박았다”고 말했다.
중구난방식으로 운영되는 교육재정을 통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동욱 제주대 교수(회계학과)는 “가령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사업의 경우 교육청도 하고 도(道) 나 시(市)에서 중복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있다”며 “교육재정을 총괄적으로 볼 수 있는 통계시스템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종 해법은 증세뿐
각기 다른 해법을 내놓은 전문가들은 결국 증세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모두 공감했다. 누리과정 파행 사태를 계기로 박근혜 정부에서 못 박은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다시 힘이 실린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경제학부)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모두 재정 위기라면 해법은 증세 뿐”이라고 말했다. 현재 내국세의 20.27%를 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수가 좋지 않기도 했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추진된 감세정책으로 규모가 줄어들었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때문에 현 정부의 ‘성역’과도 같은 법인세를 올려야 사태가 본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강 교수는 “2014년 기준 삼성전자 단일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규모가 1조7,000억원”이라며 “앞으로 늘어날 복지재정에 대한 부담을 서민과 중산층에게 요구하기 위해서라도 재벌ㆍ대기업에 대한 세수증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석 교육재정파탄극복국민운동 집행위원장도 “절대적인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부자 증세, 법인세 늘리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다만 이정욱 덕성여대 교수(유아교육과)는 “복지를 위한 증세는 불가피하다”면서도 “누리과정의 경우 2014년까지 교부금 외 국비지원이 이뤄졌던 만큼 일단 국비 지원을 하는 방향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김현수기자 ddacku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