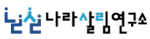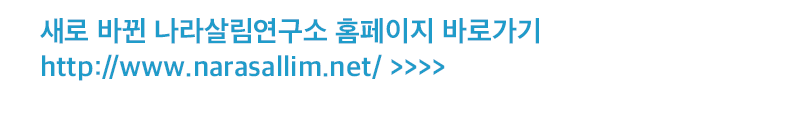[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 기사입력 2014-03-17 11:07
제2의 산천어축제, 나비축제 등을 꿈꾸며 각지에서 지역축제들이 우훅죽순 생겨나는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눈앞의 흥행만을 좇다 단발성 이벤트로 그치거나 소수에게만 수익이 돌아가는 등 축제의 본질이 퇴색하는 경우가 실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해당 주민들이 기획 초기단계부터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자체가 축제에 매몰돼 예산 편성 시 시설투자에만 집중하는 꼼수도 버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가장 큰 문제는 범람할 정도로 지역축제가 도처에서 진행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전국 시ㆍ도별 지역축제 개최 계획’에 따르면 연간 2429개의 축제가 열리고, 이 중 국고지원을 받는 축제는 총 720개에 달한다. 이렇게 많은 축제가 열리면 성격이나 주제가 다양할 법한데 겹치기 축제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이순신을 주인공으로 삼은 축제가 8개였다. 세종을 소재로 한 축제가 6개, 율곡ㆍ정조ㆍ다산 관련 축제도 다수였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지는 원인으로 축제기획 대부분을 외부 기획사에 맡기는 관행이 꼽힌다. 흥행이나 상품성을 고려하다 보니 일단 손님을 최대한 끌 수 있는 방안으로 외부 전문인력에 맡긴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지역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보다는 외부에서 기획사를 불러 일회성으로 축제를 진행하려는 지자체의 행정관행이 문제”라며 “이를 위해 지역 주민들이 직접 축제기획 초기부터 참여해 살아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상당한 축제들이 즉흥적으로 기획되는 건 분명 문제다. 지역주민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 축제의 목적인데 외지 사람만 많이 온다는 것은 본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축제가 야기하는 불균형적인 예산편성 문제도 지적됐다. 정 소장은 “지방예산 특징은 최종 예산 책정 때 10% 정도가 항상 늘어나는데 이 중 대부분이 건설 예산”이라며 “추경예산 편성에는 사람들의 관심이 적어 지자체들이 이때 건설예산으로 돌리기 때문에 복지 비중이 되레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결국 축제 등 이벤트에 필요한 각종 시설을 짓기 위해 추경예산을 활용하지만, 주민들의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이나 문화부문 예산을 늘리고 이를 통해 축제의 질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안전행정부에서 지자체 축제 관련 예산편성이나 개선사항을 체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장악이라는 점에서 반론도 맞서는 실정이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